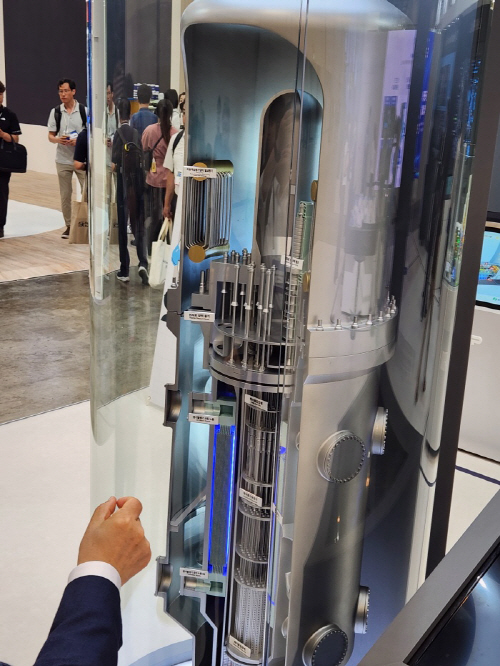국내 원전, 인허가·안전성 평가 비효율
“계속운전 개선, 재생e 확대 병행해야”
|
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원전 선진국은 최대 20년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거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가동 원전 94기 중 91%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64기가 실제 계속 운전 중이다. 일부 원전은 2차 계속운전으로 80년 운전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내 원전은 고리2·3·4호기, 한울1·2호기,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인허가와 안전성 평가에 수년이 소요돼 AI 산업 전력 공급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설비 개선 후 10년만 운전하면 사업자와 기관 모두 부담이 크다"며 "미국 사례처럼 운전기간 연장과 심사 절차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도에서는 계속운전 승인 후에도 실질 10년을 채우기 어렵고, 원전 1기 정지 시 손실이 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계속운전 심사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중복 항목을 조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청 기간과 설비 개선, 심사 기간이 맞물려 실제 운전 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AI 산업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공급 단가 문제로 LNG 발전과 병행해야 하며, RE100 목표 달성은 형식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인 후 10년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20년 연장 방안을 검토해야 산업계 투자 부담과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달성할 전략적 과제라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력 수요 예측 곡선을 보면 반영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단기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력 수급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폭증할 전력수요를 대비해 조금 더 여유 있는 전력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수요의 과소 예측은 원자력과 LNG 등 발전원의 건설 계획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과대 예측했을 경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손실보다, 과소 예측에 따른 정전 등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빠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