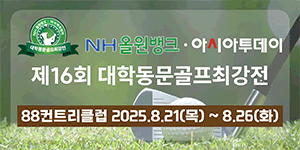중국-온라인, 일본-오프라인 공략
'사면초가' 韓 유통가 점유율 타격
|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표 할인형 종합잡화점 '돈키호테'가 국내 상륙에 나섰다. GS25는 오는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 유리돔에서 '돈키호테×GS25'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돈키호테의 국내 첫 공식 판매처로, 향후 GS25 전국 매장으로 제품 판매가 확대될 계획이다. 좁은 공간에 다양한 제품을 빽빽하게 진열하는 '압축 진열' 방식과 다채로운 PB상품 구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돈키호테는 글로벌 6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일본 다이소의 모회사인 다이소 인더스트리즈가 운영하는 생활잡화 브랜드 '쓰리피(THREEPPY)'와 일본 최대 생활잡화점 로프트(Loft)가 국내에서 최근 상표권 출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쓰리피는 2018년 일본에서 첫선을 보인 '300엔숍'으로, 20~40대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인테리어 소품과 문구, 뷰티 제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생활잡화 브랜드다. 로프트는 문구를 중심으로 화장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도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일본 브랜드들은 체험형 오프라인 리테일 경험과 디자인 차별화, 독창적인 상품군을 강점 삼아 한국 오프라인 유통에 직접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 일본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이 있다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세가 거세다. 2018년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는 7년 만에 국내 2위 사업자가 됐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6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05만명으로, 국내 종합몰 중 쿠팡(3394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전월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쿨하게 준비해' '바캉스 세일' 등 계절 프로모션과 함께 24시간 고객센터, 간편결제, 빠른 배송 등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이용자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특히 항공권·숙박·입장권까지 예약 가능한 '알리익스프레스 트래블' 서비스도 국내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대 중이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와 성원 덕에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로컬 서비스 강화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들도 국내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테무는 MAU 기준 국내 4위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둥닷컴(JD.com)은 국내 물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 자회사인 징둥로지스틱스가 인천에서 풀필먼트 창고 운영 담당자를 채용하며 이커머스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성비 소비 확대에 따른 시장 재편"으로 분석한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초저가 상품 중심으로 소비를 재구성하고 있다"며 "합리적 소비 패턴이 장기화될수록 일본 오프라인 브랜드와 중국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1] 고객이 일본 돈키호테에 입점한 GS25의 넷플릭스 점보 팝콘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https://img.asiatoday.co.kr/file/2025y/07m/04d/2025070301000361800020561.jpg)